기독교 교리사 분야에 있어 대가인 야로슬라브 펠리컨(Jaroslav Pelikan)의 최근 책 <<Whose Bible is it?: A Short History of the Scriptures>>는 내 기대에는 어긋난 책이었다. (방금 검색하다가 알게 된 것인데, 이 양반 올해 5월달에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이 책이 그 양반의 많은 저서들 중 마지막으로 쓴 책이 되겠다.)
이 책이 펭귄 북으로 편집되어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진작 알아보았어야 했는데(싸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사기도 한 거지만), 이 책은 일반 대중을 위한 입문서 성격을 지닌다. 이 양반 책 중에서는 가장 눈높이를 낮춘 책이라 생각되는데, 그런 책을 써 본 경험이 적어서 그런지 좀 들쑥날쑥하다.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다가도, 어느 부분에서는 고차원적인 문장이 튀어나온다. 일반인을 상대로 했다고 책이 재미없을 이유는 없는데, 이 책은 좀 지루한 대목이 많았다. 성서 구성이 어떻고 무슨 내용이 있는지 등이 죽 설명된 전반부는 더 그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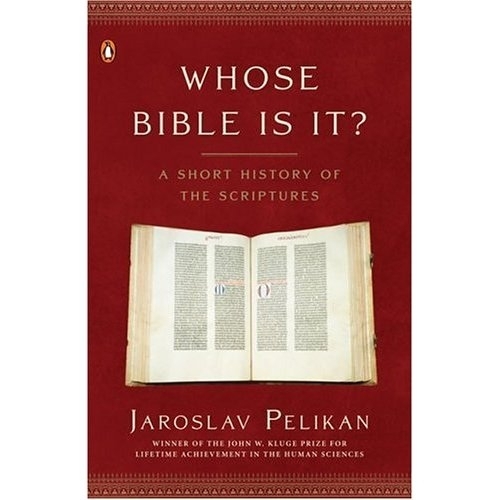
펠리칸이 이 책 저술에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서문에서 잘 밝혀져 있듯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성이다. 제목에서 그냥 성서(the Bible)이라고 하지 않고 경전(Scriptures)이라는 단어를 쓴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는 같은 경전을 소유한 두 종교 전통들이 각자 어떤 해석을 발달시켜왔고 때로 상호 관계를 가졌는지를 그려보인다. 더 나아가, 기독교인이라는 그의 자리에서, 과연 기독교에서 구약의 위치는 무엇인가라는 방대한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유지하고 있다. [구약(Old Testament)은 기독교적 시각을 담은 단어이고, 학계에서 통용되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용어는 히브리 성서(Hebrew Bible)이다. 그러나 실제 유대인이 존재하지 않는, 대신 기독교인들 머릿속에 있는 몹쓸 유대인만 존재하는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올바름’은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힘들고, 따라서 히브리 성서라는 말이 일반화될 수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다. 물론 펠리칸 책에서는 단어 하나하나의 선택에 이러한 정치적 문제에 대한 고려가 깃들어 있다.]
책의 마지막 대목에서 그의 입장이 잘 드러난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고전 15:21)라는 구절은 하느님이 인류와 맺은 일련의 언약(covenant) 혹은 계약(testament)에 대한 것이다. [주: 'covenant'나 'testament'나 같은 의미이지만, 전자가 유대교의 입장을 담고 있다면 후자는 기독교의 입장을 담은 단어이다.] 이것은 두 계약에 관한 것이니, 하나는 아담을 통한 것이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다. 그러나 언약에는 그것들 말고도 노아를 통한 것, 아브라함을 통한 것, 모세를 통한 것이 있다.
기독교인들은 이들 언약들을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과의 변증법적인 관계로 설정해왔다. 즉, 아담을 통한 죽음과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과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 모세를 통한 율법과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그러나 히브리 성서를 더 깊이 연구할수록, 우리는 그 변증법들이 너무나도 단순화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라는 순전한 사실로 인해 아담을 통해서도 “생명”이 있고, 우리는 모두--유대인이 되었든 기독교인이 되었든 아니면 무슬림이 되었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에 아브라함 안에 “성취”가 있으며, 토라에 나온 대로 혼돈으로부터 해방된 것이기에 모세를 통한 “복음”이 있기 때문이다. (250)
죽음/생명, 약속/성취, 율법/복음의 구도는 “구약”을 자신의 체계 안에 정리하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도식들이다. 그러나 펠리칸은 지적인 솔직성을 바탕으로 그러한 흔한 대답들이 히브리 성서를 지나치게 무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두 대립적인 언약이 아니라, 연속적인, 나중의 것에 의해 파기되지 않은 다중의 언약"들"이 있음을 주장한다. 다중의 언약을 안고 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대가는 침묵한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한 인정이 기독교와 유대교 간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최소한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그는 지적한 듯하다.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