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원래 김형효의 <<원효의 대승철학>>에 대한 서평 과제로 쓰기 시작한 것이다. 김형효는 원효나 불교 전공자도 아니고, ‘원효 책의 서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솔직한 목표를 위해 그 책을 썼고, 나는 그러한 목표에 맞게 김형효 덕분에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서문(述大意)을 다시 읽어보고 이해하고 그 구조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되었다. 내가 김형효 책에서 얻은 것은 거기까지였다.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김형효가 주장하는 존재론적 혁명과 같은 이야기들은 그의 장광설이라 생각하지 그리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한 것을 비판하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필요한 일도 아니다. 그런 것보다는 그를 통해 원효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생긴 것에 고마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형효를 통해 원효를 읽자, 전에 가졌던 관심, 즉 불교로부터 종교학 언어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되살아나서 김형효의 책은 아예 뒷전으로 밀려났다. 내가 쓴 글의 7할 이상은 종교학사, 특히 엘리아데에 대한 것들이고 전체 글은 아예 ‘엘리아데와 원효’라는 꼴로 되어버렸다. 그러나 원효에 대한 이야기마저 별로 하지 못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원효 책에 대한 나의 독서가 너무나도 미진하기 때문이다. 한 학기 동안 읽긴 했지만 그것은 참을성을 바탕으로 듣고 눈에 집어넣기만 한 물질적 독서이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독해는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야 전에 완전한 무의미였던 내용이 무엇을 지시하는지를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학기말보다는 학기초에 어울리는 글이다. 종교학의 이러이러한 문제의식과 원효가 어떻게 만나는가를 알아보겠다는 다짐을 밝힌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읽어보겠다는 포부가 담긴 이러한 글을 이상하게도 한 학기를 정리하면서야 쓰게 된 것이다. 다음 기회에 원효의 책을 이해하면서 들여다보겠다는 식의 태도이지만, 그런 식의 '다음 기회'가 없으리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안다.
“성(聖)과 속(俗)”에서 “진(眞)과 속(俗)”으로
-<<금강삼매경론>>과 종교학의 범주 구성
0. 여는 글
김형효의 <<원효의 대승철학>>을 읽으면서 원효의 글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들어섰고 <<금강삼매경론>> 여러 부분을 다시 읽게 되었다. 김형효의 도움을 받아 원효를 읽으면서, 엉뚱하게도 엘리아데가 눈에 밟혔다. 그래서 이 글은 김형효의 원효 이해를 평하는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원효를 읽으며 생각났던 종교학 이야기를 정리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종교학자들이 고민해온 문제, 특히 엘리아데가 성과 속의 이론을 통해 천착한 문제는 분명 원효의 이야기와 만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종교학자들, 특히 종교현상학 전통에 속한 학자들은 종교 현상이 사회과학의 객관적 언어로만은 완전히 서술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다. 나는 원효의 언어가 그들에게 제시해주는 가능성이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원효를 통해서 종교학사를 관통하는 쟁점인 종교를 이해하기 위한 범주 구성에 대해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종교학 이론의 언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불교 언어가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원효를 통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 생각을 담아내고자 하는 이 글은 일단 관련되는 종교학의 논의를 다소 지리하게 열거한 뒤 원효의 언급에 대해 간단히 고찰하고 성급히 글을 맺는 방식을 취한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글은 <<금강삼매경론>> <술대의>의 다음 한 문장의 그늘 아래 있음을 밝힌다. 다음 문장을 어떻게 음미하느냐가 앞으로의 논의에서 매우 중요하다. “삼공의 바다는 진과 속을 융화하여 깊고 넉넉하다. 깊고 넉넉하여 진속의 두 세계를 융화하되 하나로 합일하지 않는다.” (三空之海, 融眞俗而湛然, 湛然融二而不一.)1)
1. 리얼한 것이 종교다
1.1. 리얼함, 종교학사의 숨은 키워드
종교학자들의 기본적인 고민은 인간의 종교 경험을 이해하도록 해주는 종교 개념 설정의 문제이다. 그것은 서양의 전통적인 종교 이해, 즉 기독교적인 종교 이해를 넘어 인류의 종교 경험을 서술할 수 있는 구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하다. 종교학의 선조에 해당하는 학자들의 종교 정의를 보자. 슐라이어마허는 종교를 개인의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했고 막스 뮐러는 종교를 “유한자의 무한에 대한 인식”이라고 했다. 이 논의들에는 절대자와 개인이라는 신학적인 구도, 유한과 무한이라는 칸트식의 구도2)가 아직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논의에는 종교를 인간 인식 내의 현상으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가져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종교학자들이 종교를 마음의 문제로 이해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실재적(real), 그리고 실재(reality)라는 말들이다. 이 표현들은 여러 저작들에서 종교 경험과 종교를 나타내는 중요한 언어로 사용된다. 그래서 나는 실재(reality)가 종교학사에서 숨어있는 키워드라고 생각한다. 이 점을 가장 정확하게 지적한 학자가 윌리엄 제임스이다. <<종교 경험의 다양성>>의 결론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주적이고 일반적인 것을 다룰 때, 우리는 실재의 상징들을 다룰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현상으로 다룰 때, 우리는 그 표현의 가장 완전한 의미로 실재들(realities)을 다루게 된다.3)
“그 표현의 가장 완전한 의미로서의 실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제임스는 계속해서 설명한다. 인간이 어떠한 사물을 경험할 때, 그것은 객관적인 대상에 대한 동일한 그림을 마음 속에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경험은 대상에 그것에 대한 의미가 부가되어 지녀지는 것을 의미한다. 경험하는 이의 내적 상태에서 의미라는 잉여가 부가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실재를 의미한다.4)
1.2. 리얼함/진실됨/현실/실재
개개인의 마음 속에서의 의미부여는 종교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대목이다. 이것을 언어로 포착하기 위해서 많은 종교학자들이 리얼(real)이라는 형용사, 리얼리티(reality)라는 명사를 활용하였다. 인간에게 리얼한 것이 종교이며, 종교에 대한 연구는 리얼리티에 대한 탐구이다. 영어 ‘리얼’은 주관과 객관을 넘나드는 힘이 있는 언어이다. ‘리얼’은 현실에 대한 묘사일 때도 있고 인식 속에 담긴 사실성을 표현할 때도 있다. 진실의 문제가 세계와 마음 두 측면에 모두 걸쳐있음을 이 언어는 어렴풋이 지시한다. 종교학자들은 이 넘나듦의 힘에 의존하여 종교현상을 묘사하곤 하였다.
우리말로 번역될 때 이 언어의 힘은 많이 죽는다. 영한사전을 보면 ‘리얼’의 뜻풀이로 “진실의, 진짜의, 현실의, 실제의, 실재하는, 객관적인, 실질적인, 사실상의” 등이 실려 있다. ‘리얼리티’의 뜻풀이로는 “진실, 진실성, 본성, 사실, 현실(성), 실재, 실체” 등이 실려 있다. 주로 객관적 사실에 해당되는 쪽으로 번역되는데, 이 때 인식상의 실재라는 의미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명사형인 ‘리얼리티’를 번역한 경우 의미의 고착화가 더 심하다. 올바른 상태는 아니겠으나, 우리나라 언어 현실에서는 'real'이라는 같은 단어가 번역되어 ‘실제의, 현실적인’이 될 때는 객관적인 실재 쪽을 강조하고 영어 발음 그대로 ‘리얼하다’로 될 때는 인식의 실재를 더 강하게 지시하는 경향이 있다. 종교학에서는 ‘리얼’을 주로 ‘실재적인’이라고 번역하며, ‘리얼리티’는 ‘실재/실재적인 것’으로 번역한다. 이 번역을 통해서 영어가 지닌 세계와 마음 두 측면 간의 긴장이 살아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만, 한국 독자에게 쉽지 않은 주문임에는 틀림없다.
1.3. <오아시스>의 리얼함
이창동 감독의 영화 <오아시스>에는 앞서 논의한 방식의 리얼함이 잘 묘사된다. 정신지체자인 한공주(문소리)와 종두(설경구)의 사랑을 그린 이 영화는 온통 한공주의 상상으로 점철되어 있다. 현실적으로는 절망적인 조건과 변태적인 행각으로 보이는 행위들이 한공주의 인식 내에서 다른 완결적인 세계로 그려진다. 희망 없는 아파트에서 먹고 싸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공주가 하루 종일 누워서 거울로 만들어내는 영상을 나비로 상상하는 장면에서 시작하여, 그 상상은 “내가 만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종두와의 연애의 상상에서 절정에 이른다. 내가 이 영화 이야기를 끄집어 낸 것은 영화평의 한 대목을 소개하기 위해서이다. “<오아시스>의 해피엔딩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라는 글5)에서 평론가는 이 영화는 비정상인의 문제이지 사회경제적인 투쟁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들의 적은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전선을 만들 수 없다. 그들은 리얼하게! 싸워야 할지, 환상적으로! 꿈꿔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여기서 사용된 ‘리얼’에 주목하기 바란다. 환상과 대조되는 의미에서 현실이라는 한 면만을 지시하는 언어이다. 영화에서 느껴지는 리얼함과는 반대되는 의미로, 종교학자들의 용법과 다르게 사용된 ‘리얼’이다. 리얼함의 의미를 수용할 수 없는 평자에게 현실과 인식, 마음과 세계를 넘나드는 진실됨, 즉 리얼함을 은유하는 오아시스가 보일리가 없다. 리얼함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지 못한 그녀가 “<오아시스>를 보고 나도, 내 눈엔 온통 사막만 밟힌다.”고 말한 것은 당연한 일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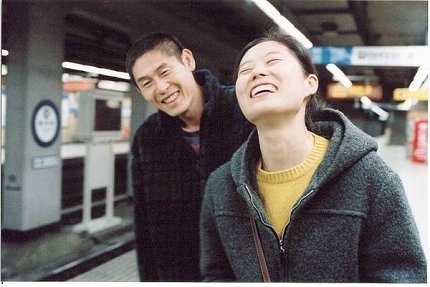
잠시 김형효 책에 대한 언급을 하자면, 저자는 존재론적 혁명과 소유론적 혁명의 대조를 줄기차게 이야기한다. 맑시즘이나 유학의 교조적인 주장들은 오직 유(有)에 근거한 시도들이기에 실패로 끝났다고 단언하면서, 자아의 인식론적 변화에서 출발하는 원효의 철학은 존재론적 혁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위에 인용된 영화평론가의 입장은 소유론적 혁명이라 할만하다. 나는 김형효가 주장하는 바를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수사(修辭)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 깨달음에 대한 성찰은 지금껏 종교가 해왔던 방식으로 전도(傳道)되는 것이지, 그것을 전사회적으로 공유할 다른 현실적인 방안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혁명 운운하는 것은 공허하다. 다만 그가 말하는 대의에는 공감하기 때문에, 그것을 혁명이 아니라 다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다. 그러한 입장에서 나는 유(有)의 세계에 갇힌 리얼함밖에 보지 못하는 위의 영화평론가를 딱하게 생각한다. 교조화시키는 접미사 ‘-이즘’이 붙은 리얼리즘은 유(有)에 갇힌 리얼함밖에 산출하지 못한다. 그러나 종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다른 식의 리얼함을 추구한다.
2. 성과 속
2.1. 엘리아데의 성스러움과 실재
엘리아데가 종교를 규정하기 위해서 새로이 도입한 개념은 성스러움(the sacred)이다. 성스러움은 속됨과 대조적인 개념으로 설정된다. 엘리아데는 성과 속의 구분을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으로부터 받아들였다. 그러나 뒤르켐이 성스러움을 ‘구분되고 금지된 것’(things set apart and forbidden)이라는,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설정된 영역으로 본 반면에, 엘리아데는 성을 속의 반대되는 것으로 이야기할 뿐 딱히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엘리아데가 성스러움을 이야기할 때 실재적/실재의 표현이 항상 뒤따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종교학사에 전승되어 오는 실재의 개념, 종교는 리얼한 것이라는 통찰을 성스러움 개념에 담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엘리아데는 <<성과 속>>의 서문에서 성스러움과 실재와의 관련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고대인들에게 성스러움은 힘에 상응하며, 궁극적으로는 실재에 상응한다. 성스러움은 존재로 가득 차 있다. 성스러운 힘은 실재를 의미하며 동시에 지속성과 유효성을 의미한다. 성과 속의 이원성은 흔히 실재적인 것과 비실재적인 것, 혹은 거짓실재적인(pseudoreal) 것의 대립으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종교적 인간이 마음 깊이 존재하기를 소망하고, 실재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며, 힘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6)
또 성스러운 공간7)에 대한 분석에서 엘리아데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운 공간을 그렇지 않은 공간으로부터 대조적으로 이해한다. 성스러운 공간은 ‘유일하게 실재적(real)이며, 실재적으로(real-ly) 존재하는 공간’이다.”8) 성스러운 공간은 속된 공간에서 분리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관찰되는 사실인데, 그렇게 된 이유는 그 공간이 인간에게 실재적인 것으로 경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엘리아데는 성과 속이 인식 주체의 내적인 경험, 다른 말로 하면 다만 세상에 그어진 경계가 아니라 마음의 작용과 더불어 생성되는 것임을 이야기한다. 성과 속이 인식 주체 내적 현상이라는 엘리아데의 입장은 오해를 많이 받는 대목이기도 하다. 인식 내적 현상이라고 해서, 그것을 순전히 심리학적인 현상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아니며, 성과 속이 엄연히 역사적인 현상으로 지속되어 왔음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인식의 현상이면서도 역사적 현상이라는 이 관계를 설명하는 일은 쉽지 않은데, 나는 이 대목에서 일심의 근원과 삼공의 바다라는 두 계열, 마음의 측면과 세계의 측면이 이중적으로 교차하는 원효의 논법이 설명의 논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자세한 고찰은 뒤로 미루도록 한다.
2.2. 성속의 변증법
성과 속, 두 범주는 상호변환적이다. 엘리아데는 성스러움과 속됨이 고정된 실체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맥락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성의 드러남을 성현(聖顯, hierophany)이라고 명명하는데, “성현의 순간에 어떠한 사물은 단순히 속된 무언가임을 멈추고 성스러움의 새로운 차원을 획득한다.”9) 그 이전에는 속된 사물이었던 것이 성스러운 것으로 변모한다는 것이다. “성스러움이 속된 무언가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10) 그래서 한 사물 안에 성과 속이라는 두 모순된 본성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엘리아데는 성현의 변증법(the dialectic of hierophanies), 혹은 성속의 변증법이라고 이름한다.
그러나 여기서 변증법은 어설프기 짝이 없는 개념 적용이다. 김형효는 여러 곳에서 원효가 그리는 이중성의 상관적 차이의 관계와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변증법을 이야기한다. 헤겔과 마르크스가 사용하는 변증법은 상호 모순된 이원성의 투쟁이고, 그 대립을 일원론적으로 종합하고자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차이 속에서의 동거를 지향하는 관계와는 다르다는 것이다.11) 이러한 지적은 엘리아데의 논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성과 속은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 제3의 것으로 종합되지 않는다. 성은 속으로 변화될 수 있고 속은 성으로 변화될 수 있지만, 성과 속은 각자 자신의 영역을 지닌다. 이 구도는 변증법과 대조적인 것이지 변증법이라는 언어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변증법은 분명 변화를 함축하는 유행 개념이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 대목에서 엘리아데는 혼란을 유발하는 개념을 갖다가 붙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다.
2.3. 역의 합일
엘리아데의 논의 중에서 성과 속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언어로는 ‘역의 합일’(the Coincidentia Oppositorum)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엘리아데가 신화를 분석하면서 사용한 개념으로, 신화에서 나타나는 “신성의 실제 구조는 모든 속성들을 초월하며 모든 모순들을 조화시킨다”는 특성을 가리키는 말이다.12) 두 반대되는 속성이 한 개체 안에서 만난다는 이 개념은 성과 속의 관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엘리아데는 ‘역의 합일’을 동방 기독교 신비가 니콜라스 쿠자(Nicholas of Cusa)의 저작으로부터 받아들였다. 동방 부정신학(不定神學)의 언술로부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이론적 자원을 길어올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헤겔로부터 차용한 변증법보다는 그의 이론적 구도를 표현하는 데 적절한 언어였다고 생각된다. 그는 이 표현을 통해서 동서의 수행 전통을 아우르는 지점까지 논의를 확대한다.
금욕가들, 현인들, 인도와 중국의 신비가들은 그들의 경험과 인식에서 모든 종류의 ‘극단’을 지워내어서, 완벽한 무애와 중립의 상태에 도달하고 쾌락과 고통에 무감각해지며 완전한 자기충족적 상태가 되고자 한다. 이러한 금욕과 명상을 통한 극단의 초월은 또한 ‘역의 합일’로 귀결된다. 즉 그러한 사람의 인식에서는 쾌락과 고통, 욕망과 혐오, 추위와 더위, 호오와 같은 양극들이 모두 제거되어 아무런 충돌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의 내면에는 신성 내의 모순에 대한 총괄적 깨달음에 비견될만한 무언가가 발생한다. (420)
2.4. 종교를 설명하는 범주들
종교학에서 종교를 설명하기 위해 설정한 범주들은 학자 별로 다양하게 사용되며, 이에 대한 종교학자들의 포괄적인 합의는 이루어져있지 않다. 종교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종교학사를 통해 축적된 개념들을 배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념들이 사용되었다가 버려졌는지의 역사를 배우게 된다. “결정된 성품이 없는” 이러한 상황은 지적으로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적 전승의 결핍에서 오는 혼란감을 초래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살펴 본 엘리아데의 성과 속 역시 다양한 범주 설정의 시도들13) 가운데 하나이다. 다른 학자들은 나름대로의 범주 설정을 한다. 에밀 뒤르켐은 사회적으로 규정된 의미에서의 성과 속 개념을 사용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의 성스러움은 사회적으로 분리되고 금지된 것이다. 반면에 메리 더글러스는 원시사회의 금기에서 나타나는 ‘깨끗함’ 개념에 주목했고, 그것이 성서에 나타난 금기 역시 잘 설명해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14)
최근의 글에서 조너선 스미스는 종교학계에 종교를 설명하는 주요 범주들이 혼재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것들을 다음과 같이 세 뭉치의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1) 성(the sacred/the holy)과 속(the profane/the common): 이들은 반드시 떨어져 있어야 하는 이원적, 공간적, 분류체계적 범주들이다. 두 개의 분리된 원을 생각하면 된다.
2) 깨끗함(clean/purity)과 더러움(unclean/impurity): 이들은 위계적으로 관계된 범주들로, 개인 수행자의 완전성(integrity)를 강조한다. 풍선을 깨끗함으로 상상한다면. 풍선이 터져버린 것을 더러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3) 허용된 것(the permitted)과 금지된 것(the forbidden): 이들은 행위에 관련된 구분으로, 각종 금기들이 여기에 속한다. 벤 다이어그램에서 두 원이 겹쳐진 부분을 금지된 범주로 생각하면 된다.15)
이것은 날카로운 지적이다. 하지만 스미스는 위의 내용을 별다른 부연 설명 없이 띡하니 던져놓기만 했다. 현재 개념들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이 이러하다고, 그래서 개념들이 이런 식으로 분류된다는 현상황에 대한 스케치와 정리를 해주었을 뿐이다. 이 개념들을 총괄할 어떤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후 연구자의 몫으로 남아있다.
2.5. 중간 정리
지금까지 원효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종교학에 대한 이야기만 줄창 해왔는데, 내가 종교학의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원효와의 만남에서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잠시 정리하고자 한다.
1) 종교학자들이 종교를 리얼한 것, 실재적인 것, 그리고 진실된 것으로 보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종교는 진(眞)과 핵심적으로 관련이 된다는 것이다.
2) 엘리아데의 성스러움은 이 진(眞)을 강조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성과 속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것을 진과 속으로 불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3) 성과 속의 관계는 상호변환적이다. 이에 대해 엘리아데는 변증법이라는 어설픈 용어를 쓰기도 했고, 니콜라스 쿠자의 말을 빌려 역의 합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 진속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시사해주는 바가 있다고 생각된다.
4) 종교학에는 성과 속 외에도, 깨끗함과 더러움, 금지와 허용 등 여러 설명 범주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을 교통정리해줄 지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진속(眞俗)과 더불어 염정(染淨)을 논하는 원효의 설법이 땡기는 대목이 있다.
이 정도면 원효를 읽을 때 내가 불법에는 집중하지 않고 어떤 잿밥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그 꿍심이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제 원효를, 김형효의 도움을 받아 이해된 원효를 살필 차례이다.
3. 진과 속
3.1. 두 계열의 교차적 관계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사실 “진속(眞俗)의 두 세계를 융화하되 하나로 합일하지 않는다”(融二而不一)는 한 문장에 관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이 등장하는 <<금강삼매경>>의 서문격인 ‘술대의’(述大意) 첫부분을 보도록 하자. 이 부분에서 원효의 전체 논의의 구도가 종합적으로 그려진다.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 있다.
(A1) 무릇 일심(一心)의 근원은 유와 무를 떠나 홀로 맑고 깨끗하며,
(B1) 삼공(三空)의 바다는 진과 속을 융화하여 깊고 넉넉하다.
(B2) 깊고 넉넉하여 진속(眞俗)의 두 세계를 융화하되 하나로 합일하지 않고,
(A2) 홀로 맑고 깨끗하여 유무(有無)의 양변을 떠나되 가운데 있지도 않는다.
(A3) 가운데 있지 않으며 유무의 양변을 떠났기 때문에, 있지 않음의 법이 즉 무에 머무는 것이 아니며 없지 않음의 현상이 곧 유에 머무는 것도 아니다.
(B3) 하나로 합일하지 않으며 두 세계를 융합하기 때문에, 진이 아닌 사물이 비로소 속이 되는 것이 아니며 속이 아닌 이치가 비로소 진이 되는 것도 아니다.
(B4) 둘을 융화하되 하나로 합일하지 않기에 진속의 본성이 정립되지 않는 바가 없고 염정(染淨)의 현상이 갖추어지지 않는 바가 없다.16)
이 부분을 번역할 때 김형효의 이해를 많이 따랐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따르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으로 ‘비중’(非中)에 대한 번역이 있다. 우리 논의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나 잠시 이에 대해 언급하고 지나간다. 김형효는 <<금강삼매경론>>에서 ‘중’(中)이 중도(中道)와 순환의 와중이라는 두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위 대목에서 ‘비중’(非中)은 중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순환의 와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번역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가 읽은 바에 따르면 ‘순환의 와중’이라는 다른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김형효가 예로 든 부분에서도 그러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17), 결정적으로 <진성공품>에 나오는 다음 문장이 중(中)의 정확한 의미를 밝혀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적과 실재의 두 가지 상 사이에 두 가지가 아닌 중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도 맞지 않다’고 하였다. 이미 두 변을 떠났으며, 또한 중간에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 상을 떠났다’고 하였다.”18) 이 해설에서 ‘중간에 떨어지는 것’은 공적과 실재라는 두 변에 집착하는 것과 마찬가지 수준에 있는 다른 집착에 해당하며, 그러한 이유에서 중(中)은 양변(兩邊)과 함께 삼상(三相)의 하나에 불과하다. 양변과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만일 본문이 ‘이변이비중’(離邊而非中)이 아니라 ‘이변이중’(離邊而中)이었다면 “양변을 떠나 순환의 와중에 있다”고 매끈하게 읽힐 것이며, 이것은 김형효의 철학적 논의의 틀에도 잘 부합하는 용어가 되었으리라. 그러나 본문에서 중은 별도의 의미를 부여할 만한 용어는 아니라고 보인다.
약간의 해석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나는 김형효가 제시해준 전체 구도를 따라 윗글을 이해하였다. 그에 따르면, 위의 술대의는 “일심의 근원”(一心之原) 계열(A)과 “삼공의 바다”(三空之海) 계열(B)의 두 계열들이 마치 두 실이 서로 엇갈려 왕복하면서 직물을 짜듯이 경(經)의 천을 짜고 있다. 일심(一心)의 합일적 종합[要]은 삼공(三空)이라는 분화적 갈래[宗]와 대대법(待對法)으로 엮여 있다. 일심의 근원 계열과 삼공의 바다 계열은 각각 지혜(마음)와 경계(세상)의 차원을 말하며, 그래서 일심의 지혜에서는 깨달음의 양각인 시각(始覺)과 본각(本覺)이 중요하고 삼공의 경계에서는 진여(眞如)와 세속(世俗)의 경계가 중요하다.19)
이 두 계열은 새끼꼬기와 같은 교차배어법으로 엮여 있다.20) 위 인용문을 보면 두 계열의 교차가 “A1-B1-A2-B2-A3-B3...” 식으로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A1-B1-B2-A2-A3-B3...” 식으로 한 쪽에서 메기면 다른 쪽에서 받아 논의를 더 전개한 뒤 되먹이는 역동적인 구조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게다가 B2에서 ‘융이이불일’(融二而不一)로 설했던 내용을 B3에서 ‘불일이융이’(不一而融二)이라고 앞뒤를 바꾸어서 받고 다시 B4에서 ‘융이이불일’(融二而不一)이라고 받는 교차적인 만남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형효는 이것을 노자가 <<도덕경>>에서 황홀(恍惚)과 홀황(惚恍)을 교차시켜 사용한 것과 비슷한 용법으로 본다. 이 우주의 법이 한 갈래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두 갈래가 서로 꼬이면서 앞으로 나아가지만, 동시에 그 진행이 결국 원상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앞의 것이 순환하면 그것이 결국 뒤의 것으로 역전되는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된다. 더 나아가 이것은 단순한 말바꾸기 장난이 아니라, ‘융이이불일’(融二而不一)이 이중부정의 불법의 논리를 표상한다면 ‘불일이융이’(不一而融二)는 이중긍정의 세상의 모습을 논리적으로 연출한 것이라고 주장된다.21)
3.2 종교학에 던져주는 통찰들
우리는 김형효의 이해를 따라 윗글에서 두 계열의 교차와 그 대대법적인 관계를 그려볼 수 있었는데, 이 구도를 앞서의 종교학적인 논의와 연관시킨다면 몇 가지 이야깃거리를 얻게 된다.
첫째, 마음과 세상이라는 두 차원으로 이루어진 논의의 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 절의 논의에서 우리는 엘리아데의 성과 속에 대한 논의가 마음에 관련된 것임을 살폈다. 그러나 그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성과 속은 마음의 현상인 동시에 엄연히 역사적으로 전승된 공동체의 것이기 때문이다. 성현이 의식의 역사의 한 단계가 아니라 의식 구조의 한 요소라고 했던22) 엘리아데의 입장은 학자들에게 지지리도 이해받지 못했다. 분명 엘리아데의 성과 속 개념은 뒤르켐의 사회적인 성속 개념과 루돌프 오토의 거룩함 개념을 통합한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23) 그러나 세상의 차원이라 할 수 있는 전자와 마음의 차원이라 할 수 있는 후자의 봉합은 불완전한 것이었다. 엘리아데는 두 차원의 통합적인 그림을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실재(reality)라는 다의적인 언어의 힘에 기대어 두 차원간의 넘나듦을 이야기하고자 했을 뿐이다. 이론적 구도의 결핍을 지탱하기엔 한 언어의 힘은 미약할 뿐이다.
나는 종교학적 논의에서 마음과 세상, 인식론적(cognitive) 차원과 우주론적(cosmological) 차원을 나누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원효의 밑그림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깨달음의 마음과 인식론이 같은 것이 아니며, 연기의 세상법칙과 우주론이 같을 수는 없겠다. 게다가 김형효가 여기서 세상의 차원을 자연에 내재한 로고스적 이법과 동일시하는 작업과도 결별할 필요가 있다. 종교학에서 그리는 세계는 역사적으로 전승된 것이며 공동체적으로 공유된 것, 뒤르켐적인 의미에서의 사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일단, 김형효가 원효 논의의 논리적 구조를 따와 자신의 철학적 작업에 사용하듯이, 종교학적 논의의 바탕이 될 수 있는 논리 구조를 지적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것은 순전히 언어적인 문제인데, 성(聖)과 속(俗)보다는 진(眞)과 속(俗)이 적절한 용어가 될 수 있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충분히 살펴보았듯이 종교학에서 실제로 다루는 것이 실재의 문제이며 엘리아데도 성스러움(the sacred)이라는 말을 통해 실재를 표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굳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스러움이라는 말을 기독교 전통에서 길어와서 종교 규정을 위한 범주로 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성스러움은 종교 규정에서 신(divinity)을 몰아내기 위해서 뒤르켐이 들여온 말이었다. 그의 문화적 정황에서 매우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볼 때 번역어로 들어온 성스러움에는 무시하기 힘든 기독교 아우라가 존재한다. 실제로 동아시아 전통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엘리아데의 성과 속 논의를 적용하여 연구하는 모습은 보기 쉽지 않은데, 이것은 성스러움이라는 개념이 지닌 딱딱한 느낌 때문에 받아들이기 낯설다는 인식 때문이다. 다만 개념에 대한 오해라고 하기에는 인식의 차이가 크다. 진속이라는 구분은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킬 좋은 대안적 언어라고 생각한다.
물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금강삼매경론>>에서 진과 속은 엄밀하게는 진여(眞如)와 세속(世俗), 진제(眞諦)와 속제(俗諦)라는 개념쌍을 받는 말이며, 이는 종교학자들이 의도하는 의미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검토까지 나아가지 못한 마당에 이 글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정도이다. 다만 분명히 할 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불교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논의에 활용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계 용병보다는 불교계 용병이 우리의 목적에 잘 쓰일 수 있겠다는 것이다. 다른 지적받을 만한 점으로는, 유무의 양변에 대한 설명으로 실재와 공적함[空實]이라는 말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실’(實)은 주로 실재로 번역되는데, 이것이 종교학에서 리얼의 번역어로 사용되는 실재와는 다른, 거의 상반된 의미라는 점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점은 단지 번역상의 혼선의 문제에 불과하다.
내가 여기서 성속 대신에 진속을 논의하는 것은 단순히 엘리아데 용어에 대한 더 나은 번역어로서 진속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속은 부정확한 번역일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엘리아데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이면서도 더 나은 이론을 구성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을 원효의 진속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진속(眞俗)의 두 세계를 융화하되 하나로 합일하지 않는다”(融二而不一)는 문장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바, 원효는 진속의 관계에 대한 정교한 설명을 제시해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엘리아데는 성속의 관계에 대한 정교한 이론을 제시하지 못했다. 성속의 상호변환적 관계에 대해 변증법이라는 유행어를 갖다붙이거나, 그보다 나은 용어로는 기독교 신비가의 언어에서 ‘역의 합일’을 차용한 정도였다. 이제 우리는 진속에 대한 원효의 설명에서 그 관계를 정밀하게 설명해줄 언어를 얻는다. 융화하되 하나로 합일하지 않기에, 진과 속은 각기 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복합적인 상호연관성 속에서만 존재 가능한 상대적인 개념들이다. 우리는 양자 간의 상호변환에 대한 원효의 발달된 논의를 접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이 설명체계가 이론 구성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면 우리는 진속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또 하나의 이유를 갖게 된다.
넷째, B4에서는 진속이 갖추어지는 것과 더불어 염정(染淨)의 현상이 성립됨을 말한다. 깨끗함/더러움 개념과 불교의 염/정과의 관련에 대해서는 개념사적 고찰과 이론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이 점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제시하는 데 만족하기로 하며, 김형효가 <<대승기신론소>>에서 인용한 부분을 소개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진여문은 염정이 상통하는 것을 밝히고자 바라는 것이고, 상통의 바깥에 별도로 염정이 없어서 염정의 모든 법을 총괄적으로 포섭하고 있다. 생멸문은 염정을 드러내는 것이고 염정의 법이 해당되지 않는 바가 없어서 역시 일체의 모든 법을 총괄적으로 포섭한다.24)
3.3. 진속의 관계
진속의 관계, ‘융이이불일’(融二而不一)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는지에 대해서, 나는 <진성공품>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송에 대한 원효의 해석에 주목한다. 게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연으로 생성된 것, 이것은 멸이되 생이 아니다.
모든 생멸을 소멸하는 것, 그것은 생이되 멸이 아니다.”
(因緣所生義, 是義滅非生, 滅諸生滅義, 是義生非滅)25)
이 게송에 대한 원효의 해석은 매우 난해한 구절로 알려져 있다. 김형효도 <<금강삼매경론>>에 대한 논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에 대한 집중적인 해설을 하였다.26) 그 설명을 참조하여 나름대로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이 부분에서 원효는 속에서 진으로의 변화, 진에서 속으로의 변화를 상술한다. 양자가 전체적으로 일심(一心)의 관계 안에 묶이면서도 각자의 영역을 형성하며 양자 간의 상호변화를 일으킨다. 속에서 진으로의 변화는 생성, 진에서 속으로의 변화는 소멸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의 생성과 소멸은 유무를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생과 멸이 아니라 미묘한 관계 내에서의 변화로 불생의 생(不生之生)과 불멸의 멸(不滅之滅)이라고 언표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갖는다. 이 상호변화의 구도가 이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하겠으나, <<금강삼매경론>>에 대한 심층적인 독해가 아직 뒷받침되지 않음을 고백하고, 앞으로의 분석 과제로 남기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다.
앞의 두 구절은 속제를 융합하여 진제로 삼아서 평등의 뜻을 나타내었고, 그 아래의 두 구절은 진제를 융해하여 속제로 삼아서 차별의 문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말한다면 진제와 속제가 둘이 아니지만 하나를 고집하지도 않으니, 둘이 아니기 때문에 곧 일심이고, 하나를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가 둘이 된다. (前之二句, 融俗爲眞, 顯平等義, 下之二句, 融眞爲俗, 顯差別門. 摠而言之, 眞俗無二, 而不守一, 由無二故, 卽是一心, 不守一故, 擧體爲二.)
‘인연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한 것은 일체 세제(世諦)의 모든 법을 든 것이고, ‘이것은 멸이다’라고 한 것은 속제를 융합하여 진제로 삼은 것이니, 생성된 것이 본래 적멸하기 때문이다. ‘생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생성된 것이 멸인 이유를 나타낸 것이니, 그 생성된 것은 곧 생이 아니므로 그 생성된 것을 추구해 보아도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生)의 뜻이 곧 적멸(寂滅)이다. (‘因緣所生義’者, 是擧一切世諦諸法, ‘是義滅’者, 融俗爲眞, 謂所生義, 本來寂滅故. 言‘非生’者, 顯其生義是滅之由, 由其生義卽非生故, 求其生義, 卽不成故, 是故生義卽寂滅也.)
‘모든 생멸을 소멸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 진제의 적멸한 법을 든 것이고, ‘그것은 생이다’라고 한 것은 진제를 융합하여 속제로 삼은 것이니, 적멸한 법이 인연으로부터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멸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그 적멸이 생(生)인 이유를 나타낸 것이니, 그 적멸이 적멸이 아니므로 소멸하는 것을 추구해 보아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멸은 인연으로부터 생성되는 것이다. (‘滅諸生滅義’者, 是擧眞諦寂滅之法, ‘是義生’者, 融眞爲俗, 謂寂滅法, 從緣生起故. 言‘非滅’者, 顯其寂滅是生之由, 由其寂滅非寂滅故, 求寂滅義, 不可得故, 是故寂滅, 從緣生也.)
적멸이 생(生)이라고 한 것은 불생의 생(不生之生)이고, 생의 뜻이 멸이라고 한 것은 불멸의 멸(不滅之滅)이다. 불멸의 멸(不滅之滅)이기 때문에 멸이 곧 생(生)이며, 불생의 생(不生之生)이므로 생이 곧 적멸이다. 합하여 말한다면 생성이 적멸이지만 적멸을 고집하지 않고, 소멸이 곧 생이지만 생에 머물지 않으니, 생성과 소멸이 둘이 아니고 움직임(動)과 적멸함(寂)이 다를 것이 없다. 이와 같은 것을 일심의 법이라고 한다. 비록 실제로 둘이 아니지만 하나를 고집하지 않는다. 본질이 인연에 따라서 생동하기도 하고 본질이 인연에 따라서 적멸하니, 이와 같은 도리로 말미암아 생이 적멸하고 적멸이 생이어서, 막힘도 없고 걸림도 없으며,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寂滅是生’者, 不生之生也, ‘生義是滅’者, 不滅之滅也. 不滅之滅故, 滅卽爲生也, 不生之生故, 生卽寂滅也. 合而言之, 生卽寂滅, 而不守滅, 滅卽爲生, 而不住生. 生滅不二, 動寂無別, 如是名爲一心之法. 雖實不二, 而不守一, 擧體隨緣生動, 擧體隨緣寂滅. 由是道理, 生是寂滅, 寂滅是生, 無障無㝵, 不一不異.)27)
4. 일종의 맺음
나는 인정한다. 구체적인 논의에는 들어가지 못한 채 밑그림만 그려놓은 데 그쳤음을. 내가 이해한 만큼만을 갖고 논의하다보니 실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은 논의하지 못한 채 변죽만 울렸음을. 전체적인 논의의 구도에 있어서 종교학 논의에 참고할 부분이 많다는 공부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데서 만족할 수밖에 없었음을.
참람스런 비교이긴 하지만, 원효의 불교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그의 논의의 구도에 주목하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외부인의 입장에 있다는 점에서 나와 김형효의 태도에 공통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김형효는 원효의 논의에서 데리다적인 차연의 대대법적인 구도를 발견하였고, 그것을 그가 존재론적 혁명이라고 부른 지적 기획으로 승화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김형효의 철학적 구도 안에 편입되고 활용된 원효의 논의이다. 종교학 이론의 입장에서 원효 텍스트에 접근했던 나의 입장 역시 불교적 구원에 대한 관심보다는 원효의 이론 체계에서 써먹을 만한 것이 없나 잿밥에 관심을 두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학자와 종교인의 언어는 분명 다르다. 종교인의 언어가 고백의 언어라면, 종교학자의 언어는 종교에 대한 인식의 언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학하기에는 종교인의 언어로부터 논의의 재료를 길어오는 행위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종교학자는 종교 언어를 길어다 와서 이론의 맥락 안에서 재구성하는 손재주꾼(bricoleur)의 자리에 있다. 신학적 지향에서 벗어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종교학 이론들에 기독교 전통에서 길어올린 언어들이 많은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반면에 나는 불교에서 길어올려진 언어가 종교학에서 사용되는 예들을 많이 보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불교가 종교학의 진지한 대상으로 다루어진 적이 많지 않음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내가 여기서 의도한 것은 길어올림을 위한 한 시도였다.
그러나 같은 언어적 재료를 갖고서도 종교학자들이 하는 짓은 다른 것이리라. 원효가 화쟁을 위해, 경계를 무화하기 위해 형성한 구도를 갖고 종교학자들은 분별하기 위한, 경계를 확정짓고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리라. 분별을 업으로 하는 학자들만큼 반해탈적인 족속이 또 있으랴.
1) <<한불전>> <금강삼매경론> 604쪽 중단.
2) 칸트의 구도를 그대로 놓고서, 유한자의 무한에 대한 감정을 태연하게 원효의 일심과 동일한 것으로 놓는 한자경의 <<일심의 철학>>(서광사,2002)의 논의는 굉장히 무책임하게 느껴진다.
3) William James,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New York: Touchstone, 1997[1902]), 386. 원문의 이탤릭을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4) William James,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387. 이 부분의 제임스의 이야기는 정진홍이 말하는 종교 경험의 구조, 즉 사물과 만나 겪어 지니는 과정과 비슷하다. 위에서 제임스 논의를 번역할 때 정진홍의 언어가 사용되었다. 정진홍, <<경험과 기억 : 종교문화의 틈 읽기>> (당대, 2003), 5-9를 참조할 것.
5) 황진미, “<오아시스>의 해피엔딩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 <<씨네21>> 367호
6) Mircea Eliade, Willard R. Trask (tr.), The Sacred and the Profane: The Nature of Religion (New York: Harcourt, 1959), 12-13. 원문의 이탤릭을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이동하가 번역한 <<성과 속>>(학민사, 2006[1983])의 이 부분(13)에는 'reality'가 ‘현실’로 번역되어 있다. 원문의 의도가 잘못 전달될 위험이 있는 번역이다.
7) 구체적으로, 모세가 하느님과 조우할 때 형성된 성스러운 공간에 대한 분석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출애굽기 3:5)
8) Mircea Eliade, The Sacred and the Profane, 20.
9) Mircea Eliade, Rosemary Sheed (tr.),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New York: Sheed & Ward, 1958), 12.
10) Mircea Eliade,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29
11) 김형효, <<원효의 대승철학>>(소나무, 2006), 61, 83, 95.
12) Mircea Eliade,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419.
13) 이에 대해서는 Robert D. Baird, Category Formation and the History of Religions (The Hague: Mouton & Co. N. V., 1971)를 참고할 것.
14) Mary Douglas,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Concepts of Pollution and Taboo (London: Routledge, 1966).
15) Jonathan Smith, “The Topography of the Sacred,” Relating Religion: Essays in the Study of Relig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107-8.
16) <<한불전>> <금강삼매경론> 604쪽 중단. “夫一心之源, 離有無而獨淨, 三空之海, 融眞俗而湛然. 湛然融二而不一, 獨淨離邊而非中. 非中而離邊, 故不有之法不卽住無, 不無之相不卽住有. 不一而融二, 故非眞之事未始爲俗, 非俗之理未始爲眞也. 融二而不一, 故眞俗之性無所不立, 染淨之相莫不備焉.”
17) 김형효가 예로 든 것은 <<한불전>> <금강삼매경론> 625쪽 중단에 나오는 문장이다. “두 가지 치우침(二邊)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말할 수도 없으며, 한 가운데 해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다.” (遠離二邊故, 不可說爲亦有亦無, 不當一中故, 不可說非有非無.) 나는 ‘한 가운데에 해당한다’를 ‘한 순환의 와중에 해당한다’로 읽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18) <<한불전>> <금강삼매경론> 653쪽 하단. “然空實二相之間 不存非二之中, 故言中間不中. 旣離二邊 亦不墮中, 故言離於三相.”
19) 김형효, <<원효의 대승철학>>, 51-2.
20) 김형효, <<원효의 대승철학>>, 80.
21) 김형효, <<원효의 대승철학>>, 82-3.
22) M.엘리아데, 박규태 옮김, <<종교의 의미 : 물음과 답변>> (서광사, 1990), 8.
23) Jonathan Z. Smith, Map is not Territory: Studies in the History of Relig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91.
24) <<한불전>>, <대승기신론소기회본> 741쪽 중단. 김형효, <<원효의 대승철학>>, 287-28에서 재인용.
25) <<한불전>> <금강삼매경론> 658쪽 하단.
26) 김형효, <<원효의 대승철학>>, 210-238.
27) <<한불전>> <금강삼매경론> 658쪽 하단.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