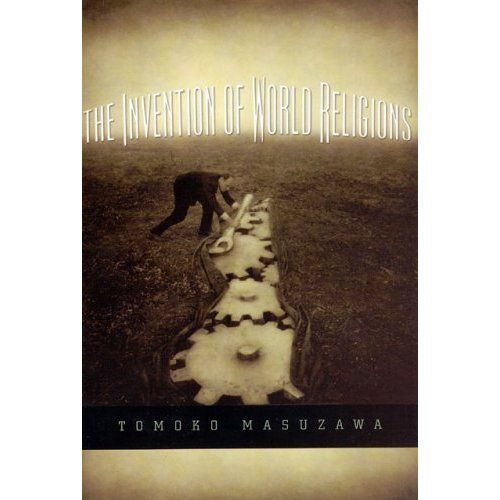마쓰자와의 최근 저서, <<The Invention of World Religions: Or, How European Universalism Was Preserved in the Language of Pluralism>>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런 식의 원색적인 비난은 생산적이지 않은, 감정의 분출일 따름이다. 나의 심리 상태상 필요한 발언일 뿐이다. 그런데 내가 존경하는 학자인 슈미트(Leigh E. Schmidt, 이 사람은 19세기 미국 종교사 전공자이다)가 그 책에서 대해 쓴 서평(JAAR(2006) 74-1: 229-232)을 읽었다. 생각했던 대로, 책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대학자가 나같은 피라미와 다른 것은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부족하므로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를 지적하는 생산적인 비평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슈미트는 이 책을 종교 담론에 대한 거대한 수술 작업이라고 비유하면서, 이 수술이 때로는 멋지지만 때로는 “느려터진 수술 과정으로 인해 보는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는 말로 서평을 시작한다. 그에 따르면 마쓰자와가 잘 한 것은 1920-30년대에 세계 종교 담론이 미국 대학가에 확립되었다는 점을 제대로 지적하였다는 점이다. (이 지적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는 마쓰자와가 펼치는 역사적 이야기가 정확성, 연결성, 맥락 서술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한다.(역사학자의 비평임을 감안하면 들으면 안되는 소리를 들었다고 보아도 된다.) 게다가 마쓰자와는 무언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할 대목이면 상투적으로 “불확실성”의 레토릭으로 빠져버려서 독자를 맥빠지게 한다.
그는 마쓰자와 책에서 가장 쓸만한 내용은 막스 뮐러에 대해 길게 분석한 장(내가 발제했던 그 장)이라고 지적한다.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는 이 대목에서 마쓰자와 자신이 자료에서 나오는 뮐러의 낯선 태도에 놀란 것 같다고 표현한다. 이 장은 종교학 논의에서 뮐러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 논의할 부분을 제공하는데, 그것은 최근 나온 보쉬의 연구(Friedrich Max Muller: A Life Devoted to the Humanities)를 참조한 덕분일 것이라는 뼈있는 지적도 빼놓지 않는다.
그 외 부분에서 논의는 “더 앙상하고 설득력도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미국 대학가를 중심으로만 주로 조사되고 유럽의 중요한 지적인 맥락이 거의 소개되지 않은 이 책이 어찌하여 “유럽의 정체성” 운운할 수 있는지를 따져 묻는다. 미국과 유럽 학계 사이의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