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길의 책 “Proper study of religion”을 평가한 아래의 글을 대략 번역한 내용이다.
Hugh B. Urban, “A contested study of religion: reflections on Sam Gill’s The Proper Study of Religion” <Body and Religion> 6-2 (2022): 280–284
조너선 Z. 스미스(Jonathan Z. Smith)의 연구와 유산에 관한 샘 길(Sam Gill)의 중요한 저서를 논하는 자리에 무언가 보태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영광입니다. 오늘날 종교학 분야에서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처럼, 저는 스미스의 폭넓은 연구에 깊은 영향을 받았으며, 샘 길 또한 독창적이고 영감을 주는 이론가로서 저에게 많은 자극을 주었습니다.
길과 저는 약 20년 전 시카고 대학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젊은 대학원생이자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이후 2001년에 길과 저는 활발하고 (제 생각에는...) 우호적인 논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당시 제가 작성한 한 논문은 길의 저서 The Proper Study of Religion에 재출판된 장 중 하나를 부분적으로 다루었습니다(Gill 1998, 2002, 2020:77–108; Urban 2001). 지난 20년 동안 종교에 대한 저의 사유는 스미스와 길의 작업에 의해 여러 방식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책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샘 길(Sam Gill)의 책에서 저에게 특히 흥미롭고 주목할 만하며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다음 과 같은 내용들이 두드러집니다:
- 종교 연구에서 비교의 역할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
- 종교의 실천과 연구에서 경험, 신체성, 그리고 움직임의 역할에 대한 논의
- 비교가 은유, 농담, 수수께끼, 놀이와 유사하게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분석(Gill 2020:65–76, 95–108)
예를 들어, 저의 연구에서는 특히 비교를 ‘은유’로서 다루는 측면에 관심이 많으며, 이 점에서 스미스와 길의 이론을 크게 차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글에서는 간결함을 위해 제가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약간 문제적이거나 충분히 발전되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핵심적인 한두 가지 점에 집중하려 합니다. 제 비평이 비판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길의 책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비평적 종교 연구에 대한 그의 역동적 접근 방식과 일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두 번째 장인 ‘No Place to Stand’에서 길은 스미스의 대표작 Imagining Religion 서문에 있는 유명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종교는 오직 학자의 연구를 통해 창조된다. 그것은 학자의 분석적 목적을 위해 비교와 일반화라는 상상적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다. 종교는 학계를 떠나서는 독립적인 존재를 가지지 않는다”(1988:xi).
길은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스미스가 종교를 상상하는 방식, 특히 비교적 병치와 재구성을 통해 접근하는 유희적(ludic) 또는 놀이적 태도에 대해 논의합니다. 길(Sam Gill)의 표현에 따르면,
스미스(Jonathan Z. Smith)의 종교 접근 방식은 ‘놀이의 형태로’(sub specie ludi) 간주될 수 있다. 즉 놀이(play)는 스미스의 종교 연구를 관통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그의 작업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스미스가 이해하는 종교는 인간 창의성의 한 형태이다(Gill 2020:79).
저는 학문적 상상력과 놀이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통찰이 매우 생산적이면서도 동시에 몇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이는 종교 범주가 세계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선험적 실체가 아니라, 주로 2차적 일반화와 상상적 구성물이라는 중요한 점을 강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자들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길은 또한 은유, 놀이, 창의성이 종교 범주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이러한 구성은 역사적 시기와 다양한 문화적 맥락을 아우르는 상상적 비교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Gill 2020:72–76; Smith 1990:5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저는 학문적 종교 연구를 이렇게 묘사하는 데 최소 두 가지 문제 혹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스미스의 “종교는 오직 학자의 연구를 통해 창조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 부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이언톨로지 교회와 같은 새로운 종교 운동에 대한 연구에서 발견한 바에 따르면, ‘종교’는 결코 학계에서 작업하는 학자들만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훨씬 더 복잡한 역사적 구성물로서 학자들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관여합니다: 종교 실천자, 기자, 변호사, 법원, 그리고 식품의약국(FDA), 국세청(IRS), 연방수사국(FBI) 등 여러 정부 기관(Urban 2013:4, 155–77, 210).
이와 같은 논리는 종교적 인정과 자유를 위해 싸워온 다른 논쟁적인 종교 단체들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미원주민 교회(Native American Church),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등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Maroukis 2010; Shipps 1985; Urban 2015:26–66). 이러한 사례에서 ‘종교’라는 지위는 단순히 학문적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변호사, 기자, 판사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한 치열한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투쟁은 학자들뿐만 아니라 법원과 정부 기관이 오늘날 ‘종교’를 정의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러시아, 호주 및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Urban 2015:135–56, 24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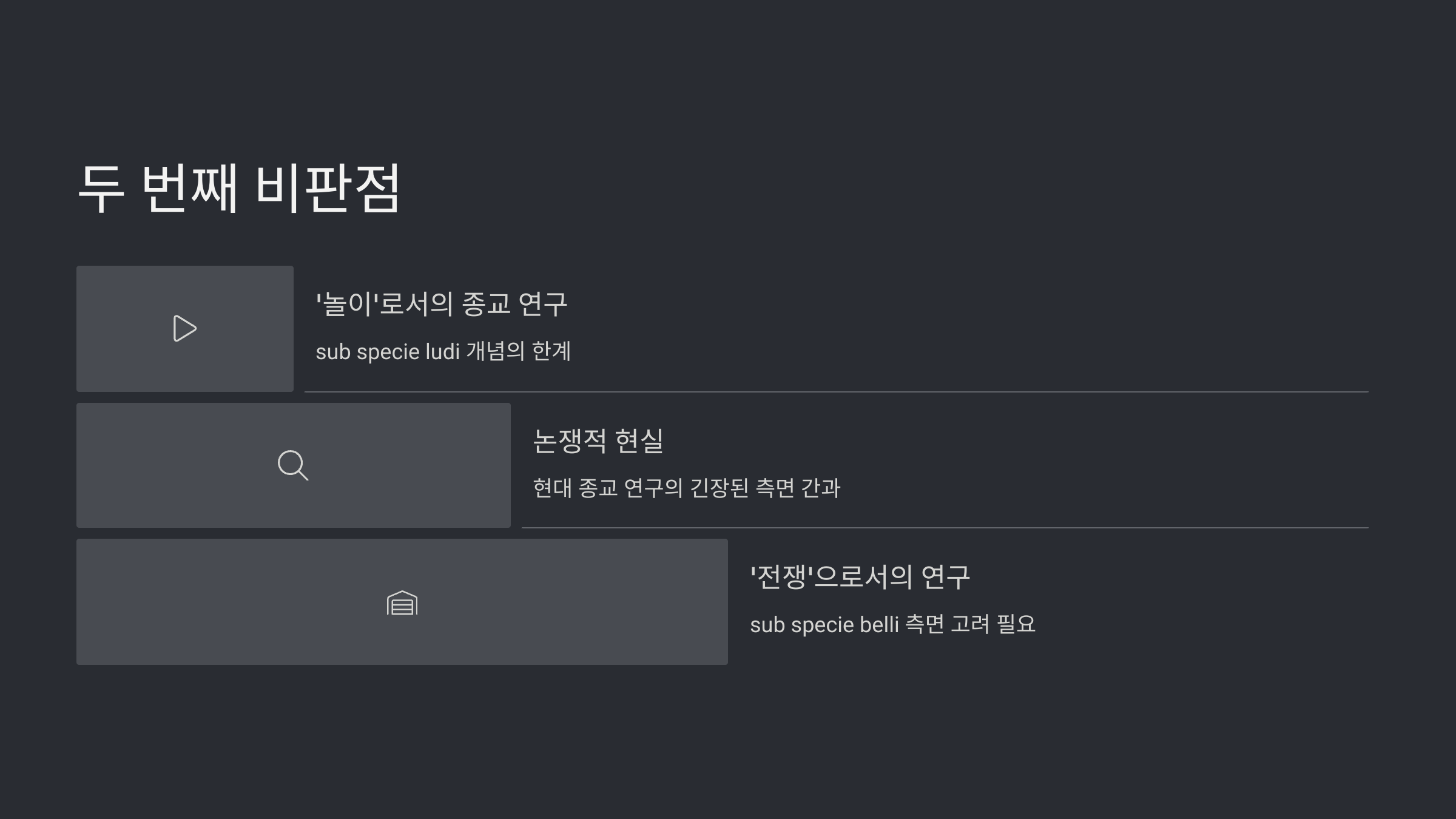
둘째로, 저는 길(Sam Gill)이 종교 연구를 sub specie ludi 즉, ‘놀이’의 형태로 묘사한 것에 대해서도 약간의 이의를 제기합니다. ‘놀이’라는 개념은 종교 연구에서 비교와 은유적 병치의 역할을 생각하는 흥미로운 방식이긴 하지만, 저는 이것이 현대 종교 연구의 보다 논쟁적이고 덜 ‘놀이적’인 측면을 간과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현대 힌두교 연구는 특히 미국에서 매우 긴장되고 불안정한 분야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힌두교 신자들은 현대 미국 학계의 인도 연구가 단순히 신식민주의적이고 신오리엔탈주의적인 프로젝트로서, 영국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최악의 유산을 새로운 형태로 이어가는 것이라고 느낍니다(Ramaswamy, de Nicholas, and Banerjee 2007; Taylor 2011; Urban 2010).
더욱이 웬디 도니거(Wendy Doniger), 제프리 크리팔(Jeffrey Kripal), 폴 코트라이트(Paul Courtright)와 같은 미국 학자들은 힌두교 전통에 대한 해석으로 인해 비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위협과 공격까지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도니거는 공개 강연 중 머리에 달걀을 맞았으며 그녀의 책 The Hindus는 인도에서 유통이 중단되었습니다. 코트라이트는 힌두 신 가네샤(Ganesh)에 대한 해석으로 인해 실제로 살해 위협을 받았고, 크리팔은 남아시아 연구 분야를 완전히 떠나게 되었습니다(Braverman 2004; Doniger 2014; Taylor 2011; Urban 2010; Vedantam 2004).
따라서 저는 종교 연구가 결코 놀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종 심각한 갈등과 때로는 폭력까지 수반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종교 연구가 창의적으로 sub specie ludi 즉, ‘놀이’의 정신으로 상상될 수 있다면, 이는 또한 매우 자주 sub specie belli 즉, ‘전쟁의 형태’로 수행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스미스(Jonathan Z. Smith)와 길의 비교 종교 연구가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하지만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재고하거나 세부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종교를 상상하는 작업은 단순히 학문적 과정만이 아니라 실천자, 변호사, 기자 및 정부 기관 등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의 여러 형태의 주체성, 상상력, 그리고 논쟁을 포함합니다. 둘째, 특히 21세기에서 종교 연구는 단순히 놀이가 아니라 종종 갈등과 때때로 폭력의 문제입니다. 저는 ‘올바른 종교 연구’가 다수의 경쟁하는 이해관계가 작용하는 논쟁적 연구로 이해되어야 하며 반드시 놀이적인 방식만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제가 이러한 논의를 길의 훌륭하고 중요한 책에 대한 혹독한 비판으로 제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스미스와 길의 모범적인 학문적 종교 연구를 특징짓는 활발한 논의와 토론, 그리고 학문적 재구성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