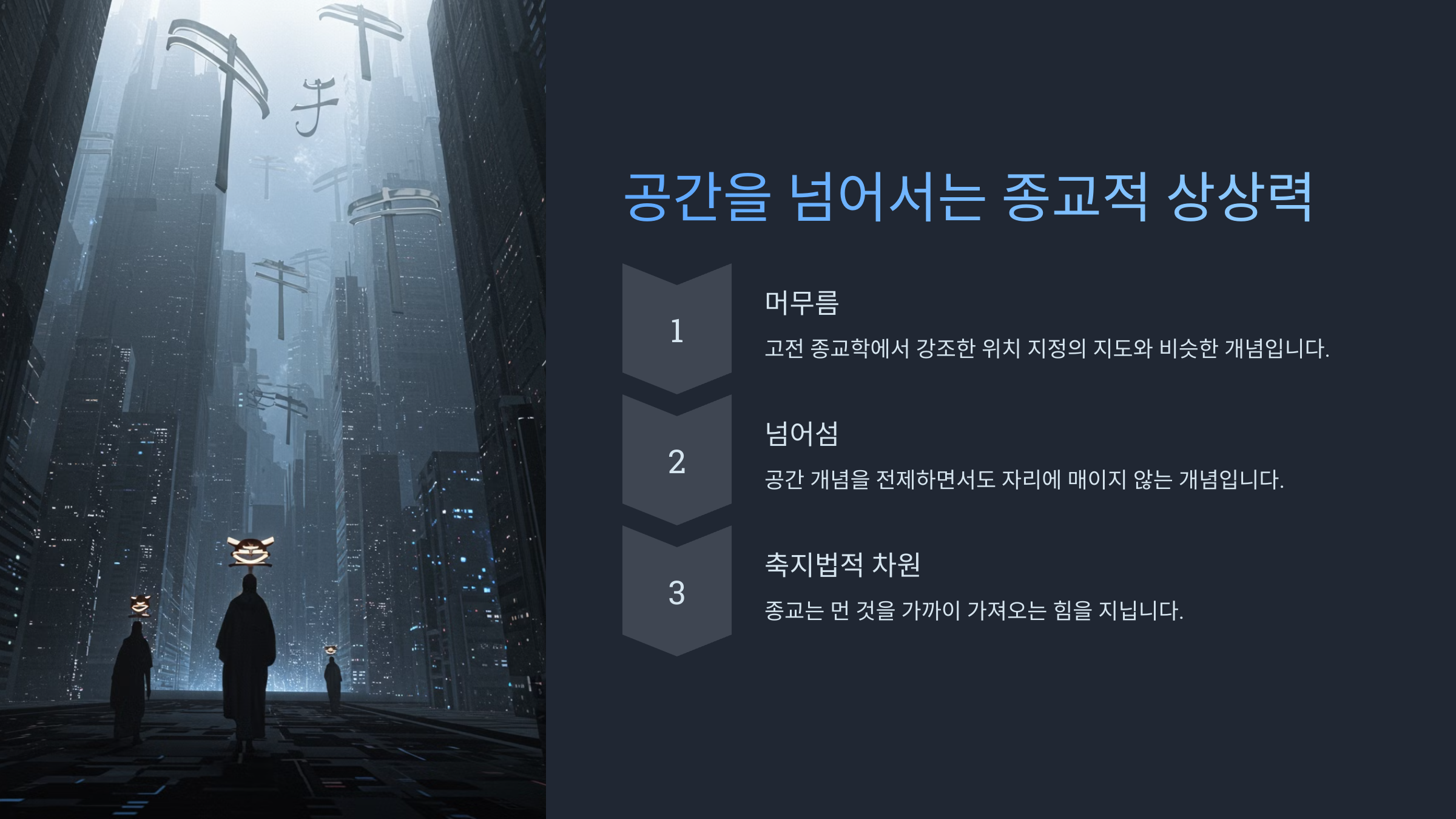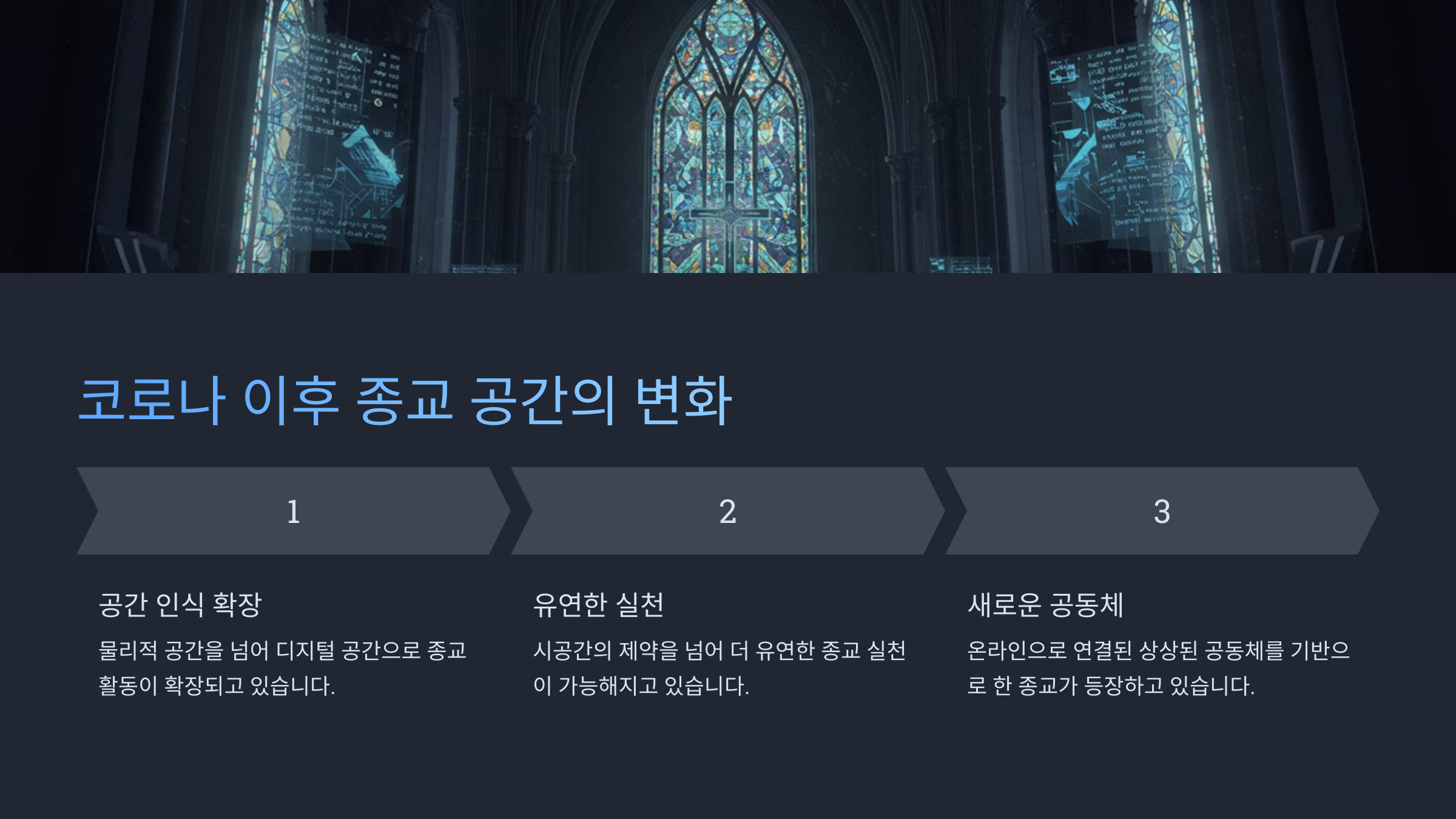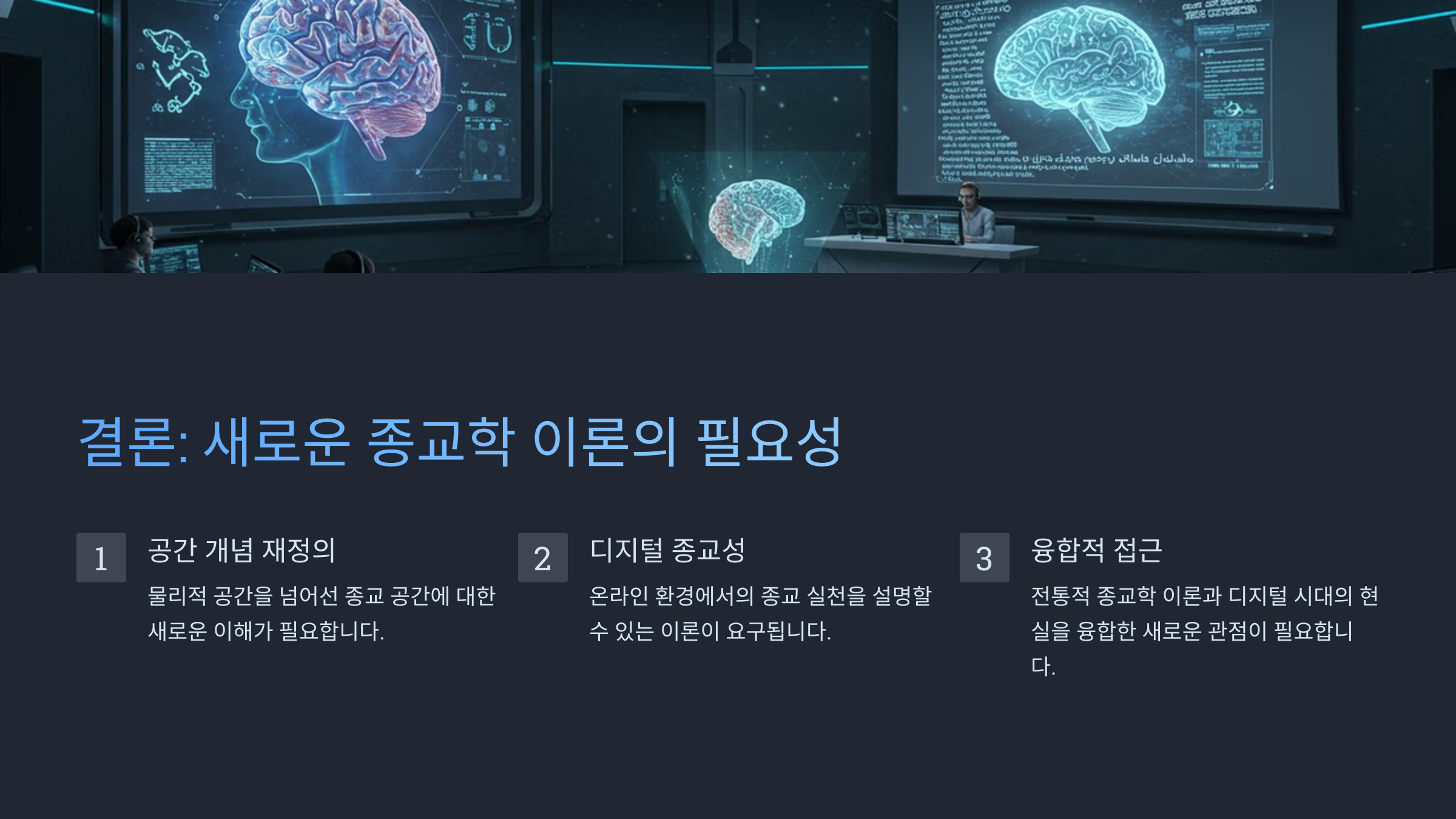코로나 유행이 1년 이상 되었던 시기에 준비한 논문. 불확정적인 시대에 시사적인 글을 쓰다보니 주제가 잘 잡히지 않았다. 애는 썼지만 결론은 평범한 편. 상황의 요청에 의해 써야 하는 글은 쓰기가 쉽지 않다.
초록:
한국의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종교는 이슈의 중심에 있었다. 한국 정부는 방역을 위해 비대면 종교 집회를 요청하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독립적 영역이었던 종교 공간에 공적 개입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개신교는 전반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수용하였지만, 일부 교회가 대면 예배를 고수하면서 논쟁이 빚어지기도 했다. 개신교회가 ‘주일성수(主日聖守)’라는 시간적 규범을 공간적 규범으로 변형해가면서까지 대면 예배를 고수한 배경에는, 근대 이후 형성된 건물 중심의 종교문화가 존재했다. 한국 개신교는 초기부터 교인들의 성금을 모아 교회를 짓고 확장하면서 성장하였다. 그래서 예배당은 물리적 건물을 넘어 교회 공동체와 동일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면서 교회 건물 중심의 종교문화에 균열이 생기고 자리에 덜 매이는 종교성을 암시하는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 종교사에서 성스러운 중심의 상실은 종교의 종말로 귀결되기보다는 성스러운 장소의 복제와 같은 대안적 종교문화의 계기가 되었다. 중심에 물리적으로 접근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인간은 특정 장소에 매이지 않는 새로운 종교문화를 창조해왔으며, 현재의 인터넷 환경에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될 여지는 크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종교적 공간에 대한 인식 전환은 새로운 종교학 이론을 요청한다. 종교학은 기본적으로 종교적 관념이 공동체의 경험에서 비롯하였음을 전제했지만, 이제는 동일한 공간을 점유한 공동체 대신에 온라인으로 연결된 상상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종교가 가능한지를 물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신자이자 유저인 의례 참가자에게 예배 개념이 확장되고 있고, 종교 공간이 확장되고 있다. 공간에 매이지 않고, 공간을 넘어서는 종교적 사유의 확장이 가속화되고, 집과 모니터를 성스러운 공간으로 인식하는 유연성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상이 회복된 이후의 교회 예배와 공존하면서 새로운 공간 관념을 형성할 것이고, 종교학 이론은 이러한 변화를 담아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AI로 요약을 시키니 그럴 듯한 비주얼이 나왔다.'